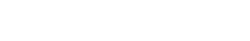음식문화는 어떠한 식재료를 어떻게 조리하여 어떤 방식으로 먹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음식문화는 발생지역의 산과 바다 또는 더위 추위 같은 자연지리 그리고 역사 종교와 같은 인문지리의 결과물이다.
최종적으로는 영양과 칼로리 공급이라는 생물학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전파 될 수도 없다.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음식문화가 자연지리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더운 지역인지, 추운 지역인지, 온대 지역인지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식재료와 조리 방법 그리고 먹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풍부한 강수량과 충분한 일조량이 있는 지역은 쌀 농사를, 추운 지역은 밀 농사를 지을 것이며, 더운 지역에는 열대 과일 등이 풍부할 것이다.
논농사 밭농사가 힘든 스텝(초원)지대 유목생활을 하는 지역은 육고기와 유제품을 먹는 음식문화가 발달할것이고 바닷가에서는 생선과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문화가 발달할 것이다.
생선이 많이 잡히는 더운 지역인 동남아에서 베트남의 느억맘, 태국의 남플라 같은 '어장(魚醬 fish sauce)'이 발달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통영과 고성 그리고 남해안 바닷가에 '다찌'라는 음주문화가 발달한 것도 자연스럽다.
이렇게 자연지리적 조건은 음식문화를 결정 짓는 가장 확실한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음식문화는 역사, 종교와 같은 인문지리의 영향도 받는다. 민족이나 특정 공동체가 겪게 되는 전쟁, 식민지배, 종교적 박해 같은 역사적 종교적 정치사회적 경험은 음식문화를 창조하고 전파하고 변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된다.
지금 우리가 먹는 '카레'라는 음식은 인도 -> 영국 -> 일본 -> 한국이라는 전파의 경로와 변형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항해시대와 영국의 인도 식민지배, 일본의 근대화와 조선의 식민지배 그리고 1960-70년대 이후 우리나라 식품의 산업화가 카레의 전파와 변형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다.
일본의 '멘타이코(明太子)'라는 음식은 식민지 시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조선의 '명란젓'이 전파되어 변화 발전한 것이다.
'안동소주'에는 몽골 고려 침략의 역사적 배경이 있고 '부대찌개'에는 6.25전쟁과 미군 주둔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몽골 침략 전의 고려는 불교 영향으로 다양한 산나물과 채소를 이용한 요리가 많았다. 이때 발달한 사찰 음식은 한국 채식 문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음식문화는 역사 종교 등의 인문지리적 배경에 의해 탄생하고 전파되고 발전한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를 최종 결정짓는 것은 인체의 생물학적 요구이다. 몸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과 칼로리를 공급할 수 있는 음식문화여야 한다.
에스키모인들은 극지방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만의 독특한 음식문화가 있다. 극지방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없다. 그래서 비타민 C 공급이 쉽지 않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비타민C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음식문화는 무엇일까?
에스키모인들은 바다표범 물개 고래나 순록 등을 사냥 하자마자 배를 갈라 콩팥을 포함한 내장을 먼저 먹는다. 이때 부신까지 함께 먹는다.
동물의 내장 중 콩팥 위에 붙어있는 부신에는 비타민 C가 농축되어 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열에 약하므로 고기를 생으로 먹거나 최소한의 조리만 한다.
이러한 음식문화 덕분에 에스키모인들은 채소를 거의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괴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들의 음식문화는 극한 환경에 적응한 진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남미의 전통적인 옥수수 요리 방식은 옥수수 알갱이를 잿물이나 석회수에 담가 끓이거나 불리는 '닉스타말화(Nixtamalization)' 과정을 거친다.
옥수수를 알칼리 처리하는 닉스타말화는 옥수수에 있는 비타민 B3의 흡수율을 높여서 B3결핍증, 즉 펠라그라(피부질환과 소화, 신경 장애) 예방 역할을 하는 음식 문화이다.
콜럼버스 교환 이후 남미에서 옥수수는 도입했지만 옥수수 음식문화를 함께 도입하지 않았던 유럽은 한 때 펠라그라로 고통받았다.
이렇게 기후와 자연환경이라는 자연지리, 역사와 종교라는 인문지리 그리고 인체의 영양과 칼로리에 대한 생물학적 요구는 음식문화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세가지 요인이다.

*이 글은 2025년 7월 발간된 《곰단지야》 92호에도 실렸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