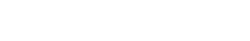언니네텃밭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언니네텃밭)은 지난 2009년 매주 제철 농사로 꾸러미를 싸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생산자형 CSA(사회적지원농업) 형태로 출발했고, 이제는 여성농민들의 온라인장터로 진화를 했습니다. 제철, 무제초제 이상, 자가 채종 농사 지향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생산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운동’인 셈이지요.
규모화, 단작화된 농사일수록 여성농민의 결정권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작목의 선택은 물론 생산방식, 출하방식 등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주로 남편이 농사의 많은 과정을 결정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성농민은 생명을 돌보는 섬세함으로 농사일을 절반 넘게 담당하면서도 막상 농사의 전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언니네텃밭을 만들었고, 많은 여성농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네텃밭은 여름이면 지역 공동체를 돌며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생산원칙에 맞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서로 간에 민주적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등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필자는 5년째 운영위원장 활동을 하므로 올해도 어김없이 지역으로 다니게 됐습니다. 공동체 점검을 하게 되면 전국 각 지역 여성농민들의 농사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농사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언니들의 농사를 직접 보는 즐거움도 있고, 텃밭 농사를 일궈내는 어려움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화석연료로 가온을 하지 않는 제철 농사로 1년 52주 중에서 48주 동안 꾸러미를 싸기 위해 텃밭에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일상화된 봄 가뭄과 냉해, 여름 초입의 지리한 장마와 한여름의 폭염, 잦은 폭우 등은 농사 자체도 힘들게 하지만, 노지 농사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렇지만 시설을 많이 이용한 농사일수록 생산비도 많이 들고, 그만큼 탄소배출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지속가능성에서 보자면 권장할 일은 아니지요.
그런 어려움을 딛고 1년 내내 꾸러미를 싸는 생산자들을 보면, 어떤 숭고함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농사도 그렇지만 공동체로 매주 만나는 과정이 참 좋다고들 합니다. 어떤 언니는 화요일에 가는 교회 같다고 했습니다. 신자들에게 교회는 더없이 은혜로운 곳이 아니던가요?
무안의 한 언니는, 언니네텃밭에 올릴 연밥을 준비하기 위해 600평 논에다가 나락 대신 연을 심었습니다. 멀쩡한 논에다가 연을 심자고 하는 아내의 주장이 남편에게 설득이 잘 되었을까요? 제주의 한 언니는 남편이 하는 관행농사와 달리 제초제를 치지 않는 생태농업을 선택하면서 농사자립을 하게 되었답니다. 각자 구역을 나누어서 자신이 짓고 싶은 농사를 짓는 것으로 했는데 그 과정이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언니들이 짓고 싶은 농사를 선택하고 확장해 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아니 지금도 그런 갈등을 겪는 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남편들이 인정을 해주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지점이 생산비가 다소 보장되는 형태의 판매에 있다고들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농사가 생산비는 턱없이 오르는데 농업소득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비자들이 생산비를 일정 정도 보장해주는 언니네텃밭 온라인장터는 든든한 뒷배가 되는 것이지요.
흔히 말하기를 ‘대안 유통 없이는 대안 생산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몸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친환경 먹거리 생산이 한동안 증가했다가도, 마땅히 팔 곳이 없어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많지 않았던가요. 물론 언니네텃밭은 아주 일부를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먹거리 운동은 개인 농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로컬푸드나 학교급식 등 윤석열정부 때 주춤했던 지역 먹거리 운동에 다시금 불이 붙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글은 한국농정신문에 중복기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