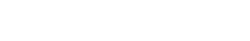2월 중순 금요일 저녁 12·3 내란 사태로 경기가 침체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었음에도, 평거동 '만리장성 사거리'와 '담배인삼공사' 사이의 유흥가에는 저녁 식사 후 주점을 찾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비슷한 시기 토요일 밤, 아직도 늦겨울 추위가 물러가지 않은 '하대동 탑마트'에서 '구 35번 종점' 사이 거리에도 술을 마시며 소식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남녀노소들이 있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어도 되지만 이들처럼 술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왠지 더 진솔한 대화가 될 것 같은 느낌은 나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취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술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고, 계속해서 개인을 파산시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또 회복하는 과정에 소비되는 경제적 손실과 시간 낭비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본다면 정말 미친 짓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왜 술에 취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가끔 고주망태가 되는 것일까?
드물지만 술을 생산하지 않는 문화권 또는 술이 허용되지 않는 문화권에서는 술 대신 대마초 같은 환각성 물질이 허용된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또는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같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 술이나 대마초같이 취하게 하는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나칠 경우 개인과 공동체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문화와 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술과 같이 취하게 하는 물질이 필요할까?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류가 지구 정복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념과 종교, 시장과 화폐, 민족과 국가와 같은 서로 간의 약속 또는 허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는 거대한 조직적 힘을 꾸려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거대한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었고, 피라미드를 쌓아 올릴 수 있었으며 황하와 같은 거대한 강의 물줄기를 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만으로는 안되고 이러한 믿음을 공유하고 연대하고 결속을 다져 조직된 힘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에는 취함을 통한 긴장 완화, 경계와 불신 해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함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대중적이고 문화적으로 허용된 물질이 술이라는 것이 <취함의 미학>의 저자 '에드워드 슬링거랜드' 교수의 의견이다. 이러한 허구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고 약속을 확인하며 서로 연대하고 결속을 다지는 데에 술이 기반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 믿음을 집단적 믿음으로 전환하는 촉매가 술이라는 것이다.
술의 어떤 면이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할까. "소수의 수렵채집 사회가 다수의 정착 농경 사회로 옮겨가자,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문화가 충돌하면서 개인과 개인 간, 집단과 집단 간에 긴장감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성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이다. 술은 대뇌 전전두피질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억제한다. 긴장이 해소되며 경계심이 줄어든다. 협력과 유대가 형성될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식량을 획득하고 음식을 나누는 투쟁과 분배의 역사이다. 그리고 고인돌을 세우고 만리장성을 쌓고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분업과 협력의 역사이다. 그뿐만 아니라 맹수와 추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공동으로 극복하는 연대와 공유의 역사이다. 그리하여 투쟁과 분배, 분업과 협력, 연대와 공유를 위한 집단 음주의 역사이기도 하다.
인지 능력을 손상시키고 억제하는 것에 비용이 들고 이득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서 술이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술과 음주 문화가 조직하고 연대하며 결속을 다지는 데 핵심적이기 때문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