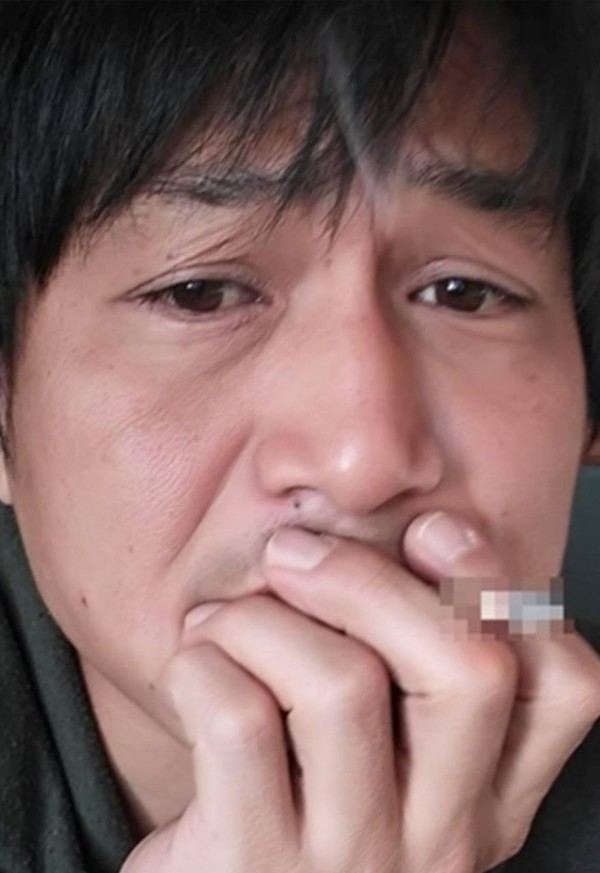점심으로 짜장면을 시켰다. 짜장을 비비다가 어지러이 뒤섞이는 양념과 면을 보면서 문득 얼마 전 끝난 혼탁한 대선이 떠올랐다. 온갖 의혹, 비방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선거였지만,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 또한 출사표를 던진 십여 명의 후보가 무색하게 거대 두 정당만의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중국집에서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과 비슷했다고나 할까? 허다한 메뉴들을 뒤로하고 다만 짜장 아니면 짬뽕. 마침 윤 당선인의 별명이 또 윤 짜장이라니, 썩 마음에 드는 비유인 듯도 싶다. 그렇다고 짬뽕은 나을까? 이 집 짬뽕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여러 이유들을 떠나 어쨌든 그간 물리도록 먹어댔던 식상한 짜장 하나 못 이긴 거 보라지.
중국집 운영도 삼십 년째 안 바뀌었다. 단체 식사 손님, 메뉴통일의 운영방침이 그것이다. 다수가 선택한 메뉴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그러니, 오늘 점심 메뉴로 짜장이 결정되자, 짬뽕을 먹고 싶었던 쪽에서 볶음밥을 고른 직원을 탓하는 요상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다. 제 입에 안 맞아서 다른 걸 먹겠다는데 웬 남 탓인지. 어차피 볶음밥을 고른 쪽도 마음에 안 드는 짜장을 먹어야 하긴 마찬가지인데.
거대 양당 체제의 늪에 빠진 우리의 한계다. 하필 둘 다 중식이다. 그 자리에 서기까지 출신배경이 조금 달랐을 뿐, 두 집단은 결국 시장주의를 깊이 체화한 정치집단이며, 구조적 모순이 산재한 이 나라를 함께 조탁해온 전통적 기득권 집단이다. 그러니 이 승부가 무슨 재미가 있으랴. 팬덤들의 무례하고 난폭한 선동들이 그나마 소소한 재미를 주긴 했지만 그런 단무지만으로는 이런 중식 요리의 본질적인 느끼함이 덮이지 않는다.
짬뽕 아니면 짜장. 소비자들의 이런 단순한 소비방식은 여타 다른 한식, 분식, 일식, 양식집을 말라죽는 게 만드는 것은 물론, 중국집 주인조차도 식자재 비용을 이유로 메뉴를 줄여갈 타산을 하게 만든다. 선거든, 점심 메뉴든 정답과 오답을 가르는 시험문제가 아니다. 짬뽕과 짜장에 질려서 다른 것을 먹겠다든지, 중식 자체가 입에 안 맞아 조금 멀고 작아도 다른 식당을 찾겠다면 존중해야 한다. 갇혀서 군만두만 먹어야 했던 영화 속 올드보이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짜장 아니면 짬뽕만 먹고 살 수가 있겠는가?
반면 소비자가 다른 요리, 다른 식당을 선택하면 건전한 경쟁이 발생한다. 중국집 주인 입장에서는 행여 단골손님이라도 빼앗길까 새로운 메뉴라도 고민하게 될 터이고, 하다못해 메뉴를 통일시키라는 운영방침이라도 바꿀 터이니, 이것은 주권자, 손님의 승리로 귀결된다. 다른 식당들도 그럭저럭 먹고살 만해져 폐업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차려질 외식상이 더욱 풍성, 다양해지는 것이다. 이건 건강에도 좋다.
주지하다시피 무상의료, 무상교육, 노동권 강화, 여성, 성소수자 차별 문제 따위의 의제들은 아직 한 번도 수권해 보지 못한 소수정당들이 들고나온 의제들이다.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의제들이 일정 부분 진척되고 아직도 활발히 논의되는 데는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준 유권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중국집을 동네 식당업계의 공룡으로 만들어 나머진 망하게 만들어놓고 먹을 게 없다느니, 서비스가 나빠졌다느니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상황을 자초한 건 우리다. 짜장 아니면 짬뽕의 구도, 다수가 선택한 메뉴로 통일. 이런 식당, 안 가면 된다. 그저 안 가는 것만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말이 많았다. 짜장 불겠다. 뭐, 이런저런 고민에 앞서 일단은 우리 앞에 차려진 간짜장이나 먹으면서 생각해보자. 철수라는 양념을 넣어 만든 신 메뉴라는데 얼마나 맛있을지. 그저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