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사는 곳은 진해에서도 신시가지까지는 20분 이상, 구도심까지는 거의 30분이 넘게 걸리는 변두리, 용원이라는 곳이다. 벚꽃 찬란한 구도심을 보통 진해의 전부인 양 여기는데, 진해는 해안선을 따라 나지막한 산들을 거느린 채, 거제를 비롯한 다도해 섬들과 나란히 대거리하며 들쑥날쑥 오밀조밀 조막만한 포구들을 품고 여기, 부산 바로 옆, 용원까지 이어진 아름다운 바다고장이다. 아니, ‘였다’라고 써야 맞겠다.
진해에서도 변두리인 여기가 요즘 소위 ‘핫한’ 동네가 되었다. 진해 최초의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생기고, 김해 장유, 부산 지사과학단지로 통하는 터널들도 다수 뚫렸다. 차로 오 분 거리에 이십여 년 전부터 조성한 녹산공단이 있고, 부산-진해 신항, 진해-부산 신항 따위의 이름으로 말도 많은 항만이 이십 수 년 넘게 조성 중이다. 바다를 메우고 공단과 항만을 조성하는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세월이 딱 그만큼이다.
기 조성된 신항 쪽에서 안골포 대교라는 다리를 건너면 웅동(조국 전 장관 부친이 세운 웅동학원이 있는 곳) 맞은편 매립부지에 이른다. 아직 조성은 덜 되었지만 군데군데 물류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는 스산한 이 공사판 끝자락에 진해와 진영을 잇는 남해고속도로 지선이 매립지 도로와 잇닿아 있다. 그즈음에서 보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내 유년기의 3년을 고스란히 간직한 섬의 자그만 능선도 보인다. 연도라는 섬이다. 아니, 이제 섬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다. 포장도로는 놓이지 않았지만 이미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육지가 되어버렸으니.
그곳은 겨울이면 아낙들이 두툼한 내피를 두르고 저만치 바다 위, 뗏목에서 무더기로 쌓인 피조개를 한창 까댔다. 저 다도해들 사이의 가깝고 얕은 바다가 우리나라 피조개의 주산지였던 것이다. 그 시절 피조개, 새조개 따위의 이른바 고급조개들은 일본으로 전량 수출되었다. 어려서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벽지에 살아본 중, 특출 난 경험이라면 경험이겠다.
이런 마을단위 사업이야 어른들의 일이고 동네 조무래기들의 일은 먹고 노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조무래기들의 놀이터로도 딱 맞춤한 곳이 또 이 섬이었다. 마음먹고 뛰자면 몇 십 분 안짝으로 동네 고샅, 방파제, 모래톱을 다 쏘다닐 만큼 자그만 동네였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건 없었다. 아니 오히려 풍족했다. 온 사방 천지가 놀 곳이었고, 먹을 것도 지천이었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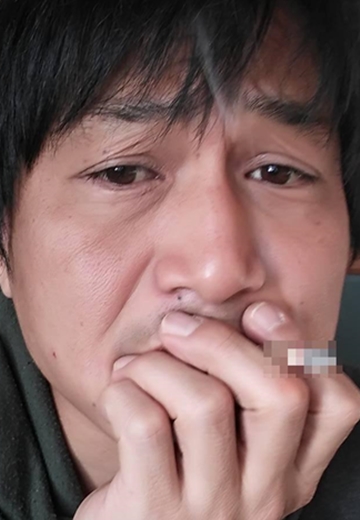
피조개가 한창인 겨울, 우리 조무래기들은 삼삼오오 모여 바닷가 갯바위에 붙은 굴을 돌로 쪼아 바닷물에 씻어 먹거나, 담치에다 게, 백합 따위의 가끔 건져 올리는 귀한 것들까지 바닷가에 지천으로 떠내려 온 솥붙이에 되는 대로 집어넣고 정체 모를 잡탕을 끓여먹기도 했다. 그것만한 안주가 따로 없었는데, 싶은 생각이 요즘도 불쑥불쑥 들곤 해서 입맛을 다시곤 한다.
여름이면 말해 무엇 하랴. 선생님을 졸라 수업을 째고 아무렇게나 입은 채로 바다에 퐁당퐁당 뛰어들었다. 물질 재주가 좀 있는 형들은 언제나 뭐든 잡아 올리곤 했고 그렇게 건져 올린 해삼, 돌문어 따위는 어른들에게도 제법 귀한 간식거리였다.
모래갯벌에서 갯지렁이를 잡아 낚시하는 날들은 또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거개 빈손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했지만 결기만큼은 높았다. 낚시는 할 때마다 대나무를 찧어 낚싯대를 새로 만들었는데, 납으로 된 봉돌을 깨물어 낚싯줄에 고정시키던 일이며, 낚시 바늘 묶는 일이 서툴러 형들에게 해달라고 조르던 일 하며, 꼬물대던 갯지렁이를 바늘에 어설프게 꿰던 일 등이 눈에 선하다. 이번엔 꼭 낚아야지 번번이 다짐했건만, 빈손이기 일쑤였고 늘 나에 비해 고기를 잘 낚았던 형에게 괜한 투정만 부렸던 기억들도 떠오른다.
물때도 그 어린 시절에는 훤히 꿰고 있었다. 연도와 그에 딸린 작은 섬 사이엔 마을 어촌계가 공동 관리하는 갯바위 지천의 석화밭이 있었고 썰물이면 두 섬이 이 석화밭을 따라 이어졌다. 시쳇말로 모세의 기적이 이 작은 섬에서도 매일 일어났던 것이다. 그 작은 섬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만 더러 건너다녔다. 저물녘까지 놀다가 물이 들기 시작하면 재빠르게 빠져나오곤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린 시절 드물게 꽤 스릴을 느꼈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동네 뒷산도 빼놓지 못한다. 섬마을 뒷산엔 봄이면 달래가 지천이었다. 달래를 몇 움큼씩 캐는 날이면 어머니가 달래 된장을 끓여주셨다. 그 맛은 잊었지만, 정말 맛있었다는 기억과 뿌듯함만은 강렬하게 남아있다. 섬 뒤편 너덜겅에서 캔 칡의 달착지근했던 맛, 그 칡을 씹으면서 바라보았던 저 멀리 다도해의 풍경은 또한 어찌 잊으랴.
이제 그런 곳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예 지도가 바뀐 것이다. 아무렇게나 생겼던 해안선이 이제 자를 대고 죽죽 그은 괘지 위의 도면처럼 반듯해졌다. 작은 통통배가 제 몸집보다 더 커다란 어구를 싣고 위태롭게 건너던 바다 위로 이제는 집채만한 차들이 굴러다닌다. 참, 얼마나 좋아진 세상이냐?
천년, 만년, 아무에게나 먹을거리를 내어주던 바다를 메우고 두터운 펜스를 치더니, 안으로는 우아한 신사숙녀 분들만 드나들 수 있도록 골프장도 만들었다. 천둥벌거숭이들이 함부로 드나들 때보다야 이 얼마나 우아해진 것이냐. 이런 것이 발전인 것이다. 너나없이 낚싯대를 던지고 둥둥 걷은 발로 수렵, 채집을 하던 무질서를 반듯하게 그은 해안선만큼이나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이 얼마나 안정적이며 보기에 정연한가 말이다.
아직은 한창 공사 중인, 내가 마음껏 뛰놀던 섬마을 바닷가는 또 어떤 벽이 설치되고 얼마나 커다란 자동차와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드나드는 격리공간이 될까? 사뭇 기대된다. 그 바다 안에 살아가던 숱한 생명들, 아무나 주워 먹을 수 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불온한 먹을거리 따위는 응당 짓밟아 없애고, 오직 위대한 자본의 지엄한 통제에 질서정연하게 복속시키는 이런 금 긋기야 말로 이 세상을 제대로 가다듬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주워 먹을 수 있는 세상이면 누가 위험한 공장에서 일을 할 것이고, 어느 누가 비정규직의 처지로 위대한 자본 앞에 머리 조아리며 살겠느냐 말이다.
여기 지척, 가덕도라는 동네에 이제 신공항까지 들어서면 이곳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물류 허브’가 될 것이다. 그 공사는, 누구 입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엄청난 재부를 창출할 것이 분명하다. 필시, 나와 너, 그리고 우리 후손의 입은 아닐 테지만. 나 같은 범부야, 주인 없는 갯바위에 붙은 굴이나 쪼고 빨아댈 줄 아는, 그야말로 빨갱이 같은 능력 밖에 더 있더냐 말이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며 몽니 부려봐야, 작게는, 기껏해야 갯바위 굴이나 까먹으려는 이기주의자, 크게는 국가발전 기간산업을 가로막는 불순분자, 빨갱이 밖에 더 되랴 싶다.
이렇게 인정하고도 부글부글 속이 끓는 것은 부글부글 공짜로 끓여먹었던 그놈의 해물잡탕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기교육이 이래서 중요한가 보다. 자유로운 채집의 경험을 거세당한 사람에게는 임금과 대형마트가 절대적인 생존수단이 될 밖에 도리 없을 테니까.
원시적 생명과 원시적 공동체의 낭만이 깃든 뻘밭은 그야말로 불온한 뻘구디다. 빨리 없애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나 같이 시답잖게 뻘소리 지껄이는 뻘갱이 지천으로 깔릴지 몰라. 나라 발전을 위해선 그래선 안 되지. 암. 바다를 향한 폭력을 멈춰라! 글쎄, 이딴 게 누구 귀에 씨알이나 먹힐 소리란 말이냐? 생선회를 신용카드로 치는 줄 아는 세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