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0년 전으로 기억한다. 친구 한 녀석과 지리산을 종주했다. 사실 웅석봉을 빼고 짧은 거리를 1박 2일로 다녀온 거라 종주라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다만, 노고단에서 출발해 능선을 타고 벽소령에서 1박, 세석, 천왕봉을 거쳐 중산리로 내려왔으니, 대강의 지리산 줄기는 눈으로라도 다 탄 셈이라 여긴다. 이 산행 중, 천왕봉에서 중산리 방향으로 길을 잡고 내려가는데 그보다 몇 년 전 올랐을 때는 못 본 나무계단을 발견하고 썩 불쾌했던 기억이 있다.
천왕봉을 오르기 직전 가파른 너덜겅(돌이 많이 깔린 비탈)에 철제 구조물을 놓고 방부목으로 계단을 놓았던 것이다. ‘여기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아니꼬운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있던 차에 마주 오는 사람이 ‘하나님은 왜 산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서 힘들게 하시느냐?’라는 말을 했다(크리스천이었던 것 같다). 딴에는 재치 있는 말이라 여겼는지 주변에 다 들리도록 몇 번이나 크게 씨우적거렸다.
기왕에 아니꼽기도 아니꼬왔거니와 계단까지 만들어 예전에 비해 훨씬 수월하겠건만 거기에 또 토를 다는 꼴이 뵈기 싫어, 기왕에 마주보고 선 김에 ‘차라리 이런 산도 쉽게 오를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달라고 기도하시지 그러십니까?’라고 대거리를 해주었다. 같이 간 친구가 꼭 그래야 했냐는 식의 핀잔을 주었지만, 내심 제 놈도 속은 시원한 모양인지 끝내 허허 웃어댔다.
굳이 오르지 않고 그저 바라만 봐도 좋은 산이 지리산이다. 진주에서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 처가로 향하거나 국도를 타고 산청 경호강변을 지날 때면 우리 꼬마들에게 말하곤 한다. “저 산이 반도 이남에서 제일 높은 산이지” “국립공원 1호야” “몇 년 전에 다녀왔어”따위의 은근한 자랑이 섞인. 내 것도 아니면서 그저 아는 것으로, 가까워서, 잠시 올랐던 것으로 자랑스러운 산. 내게 그런 산이 바로 지리산이다.
그런 지리산에 무슨 케이블카, 어떤 산악열차 등 개발 계획이 사흘이 멀다 하고 허다하게 튀어나온다. 지리산이 너르다보니 세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경계를 둔 삼도봉을 거느리고 시·군 단위로 쪼개자면 그 수가 더 허다하다보니 여기저기서 말들이 나오는 것이리라. 안다. 지리산이란 ‘자원’이 얼마나 맛있는 ‘돈’잔치로 보일지.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인데다, 지방 소멸의 시대, 지리산 권역을 둘러싼 중소 시·군 단위에서 보기에 지리산이란 관광자원이 얼마나 대단한 지푸라기로 보이겠느냐 말이다.
그러나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며 찾는 지리산의 맑은 물은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은밀한 산의 속살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란 점을. 고산 준봉의 아름다움은 다만 높은 봉우리라서가 아니라 그 봉우리가 품은 산의 골짜기, 골짜기 거칠게 주름진 능선들과 깊은 골로 인해 생기는 것임을. 그렇게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렵기에,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힘을 간직한 아름다운 지리산을 우리가 축복처럼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말이다.
지리산이 넓다 하나 실제로는 인간의 문명에 포위되어 고립된 섬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자연의 보고일 수도 있다. 관광자원 개발에 몇 천 억, 몇 조. 고용창출효과 얼마. 이것은 그저 인간의 셈법일 뿐이다. 숱하게 겪어왔지 않나. 자연을 파괴하면서 개발만능주의로 치닫다가 결국 엄청난 후과를 감당해야 했던 일들을. 당장의 주거문제와는 다르게, 사람과 생명이 살아가는 지구라는 커다란 집엔 콘크리트 구조물보다 강과 숲이 더 중요함을 우린 이미 알지 않나.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몸이 편찮으신 분도 지리산을 오를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 나는 되묻는다. 자연훼손 다 떠나서 -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에게 어차피 자연보호라는 가치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 - 그 편의를 제공하는 훌륭한 산악열차는 대체 누구의 것이냐고. 민간자본이 어마어마하게 투하된다. 그런 구조물이 들어서면 본시 그곳에 깃들어있던 동식물뿐만이 아니라 사람 일반에게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공공의 것이 사유재산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권리의 근본부터 챙겨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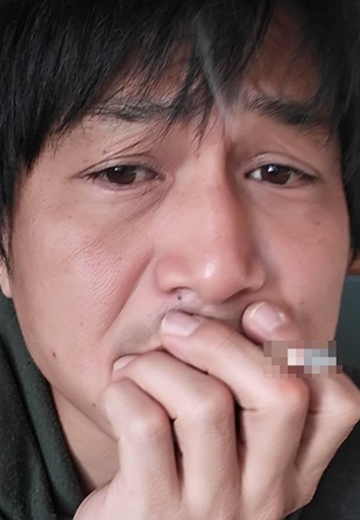
산악열차, 케이블카 다 치워라. 지금 지리산 곳곳에 박아놓은 쇠말뚝들만 해도 충분히 아프다. 풀 한포기, 물 한 모금 만들어내지 못하는 콘크리트, 쇳덩이로 생명의 지리산을 ‘개발’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자연파괴는 물론이고 공동체의 것에 쇠말뚝 박고 사유화하겠다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아무리 지자체의 이름을 걸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풀과 나무, 그 속에 깃든 생명들과 맑은 물들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합주가 바로 지리산이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지리산의 본질이다.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힘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생명에 ‘의존성’이 강하다는 것을 9할 이상 내포하는 의미다. 인간이 자연의 살아있는 뭇 것들과 ‘조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이유다. 그것이 기실 가장 이기적인 인간생존의 최적화다. 하여 지리산을 그대로 두라. 지리산이 지리산이게 하려거든.

